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새 이것저것 할게 많다보니 포스팅을 좀 늦어졌네요ㅠㅠ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입니다.
제가 서점에서 책을 사는데 손바닥만한 조그마한 크기로 제작된 시집들이 있더라구요.
이동하면서 읽기에 참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윤동주 시인의 시들을 교과서에서 밖에 본 적이 없었기에 한 번 그의 시집을 보고싶은 마음에 샀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집은 처음 포스팅해보는데요.
문득 책보다도 시가 우리에게 더 생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종종 시집으로도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시인이죠. 초등학교 때 '별 헤는 밤'을 타이핑해가며 타자연습을 하고 중학교에 올라가며 시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시 중 하나가 윤동주의 '서시' 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저항정신을 드러내는 저항시, 그리고 반성과 성찰의 정서를 대표하는 시인 등 우리가 그에 대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인데요.

오히려 익숙해서일까요? 교과서 밖에서는 그의 시를 만나본 경험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의 시 중 제 생각에 우리에게 조금이나마 덜 친숙한 시들 위주로 소개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시를 배우면서 생긴 참 안좋은 버릇이 시를 '분석'하는 습관인 것 같아요.
이건 무슨 심상이니, 이 시어는 무슨 뜻일까? 등등
오늘은 그냥 그런거 말고, 시를 보고 제가 느낀 것들을 적어볼게요.
세간의 해석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서운 시간
윤동주
거 나를 부르는 것이 누구요.
가랑잎 이파리 푸르러 나오는 그늘인데,
나 아직 여기 호흡이 남아 있소.
한 번도 손들어 보지 못한 나를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나를
어디에 내 한 몸 둘 하늘이 있어
나를 부르는 것이오?
일이 마치고 내 죽는 날 아침에는
서럽지도 않은 가랑잎이 떨어질 텐데……
나를 부르지 마오.
*가랑잎 - 떡갈나무 잎
한 번도 손들어 보지 못한 나를
손들어 표할 하늘도 없는 나를
어디에 내 한 몸 둘 하늘이 있어
나를 부르는 것이오?
저는 이 부분에서 '아직 하지 못한 일이 많은데, 하늘이여 어째서 벌써 나를 부르시는 건가요.' 하는 시인의 간절함을 느꼈습니다.
먼저 시의 제목에 확 꽂혔던 것 같아요. "무서운 시간"
우리에게 가장 많으면서 부족한 것, 가장 공평하면서,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불공평한 것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자 그렇기에 가장 무서운 것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요새 시간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시간을 꽉 잡고 살아가자니 시간에 쫓겨 오히려 시간이 제 삶의 주인이 된 것 같고, 그렇다고 여유를 즐기며 살기엔 삶이 너무 짧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사이에서 적당함을 찾아야할텐데요.
일단은 아직 가야할 길이 멀어 일단은 좀 더 고삐를 죄고 살아야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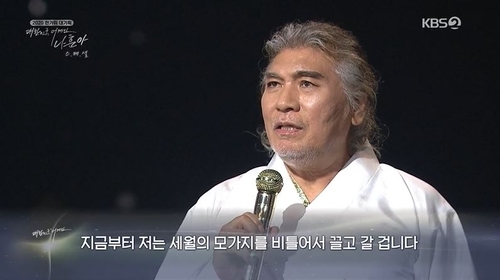
봄
윤동주
봄이 혈관 속에 시내처럼 흘러
돌, 돌, 시내 가차운 언덕에
개나리, 진달래, 노오란 배추꽃
삼동을 참아온 나는
풀포기처럼 피어난다.
즐거운 종달새야
어느 이랑에서 즐거웁게 솟쳐라.
푸르른 하늘은
아른아른 높기도 한데......
봄이 혈관 속에 시내처럼 흐른다는 말,
우리가 평상시에는 쓰지 않는 말인데 저 구절을 보자마자 아직은 겨울의 흔적이 살짝 남아 시릴정도로 시원한 봄의 시냇가가 떠올랐습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는데 어느덧 봄이란 계절을 생각하면 미세먼지 때문에 뿌연 하늘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시를 통해 제가 잠시 잊고있던 봄의 진짜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우리는 여러 시각매체에 노출되며 그 어느때보다 많은걸 시청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어느 때보다 많은 걸 못 보고 지나치는 것 같습니다.
밝은 도시의 불빛에 서울의 하늘에 별빛이 보이지 않듯,
너무 많은 매체 때문에 마음 속 생생한 상상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가 이런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보는 것보다 더 생생한 감정을 주는, 글로 쓴 그림, 시를 통해 우리가 잊고있던 감정들을 하나씩 꺼내볼 수 있는 시간을 종종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집을 포스팅해봤는데, 제가 전에 썼던 포스팅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ㅠㅠ
어디선가 어떤 작가가 자신은 시가 너무 어려워 산문을 쓴다고 했던 것이 생각나네요
모쪼록 부족한 포스팅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옹치 드림
P.S) 각자 좋아하시는 시가 있다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토록 뜻밖의 뇌과학』 - 리사 팰트먼 배럿, 뇌를 알아야 나를 안다. (40) | 2022.03.20 |
|---|---|
| 『소유냐 존재냐』 (To be or To have) - 에리히 프롬,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 (50) | 2022.03.11 |
| 『여덟 단어』 - 박웅현,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2) (39) | 2022.02.25 |
| 『여덟 단어』 - 박웅현,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1) (38) | 2022.02.24 |
| 여행의 이유 - 김영하, <여행을 통해 다시 지금의 나에게로> (47) | 2022.02.23 |



